<로쟈의 러시아 문학 강의 20세기> 고리키에서 나보코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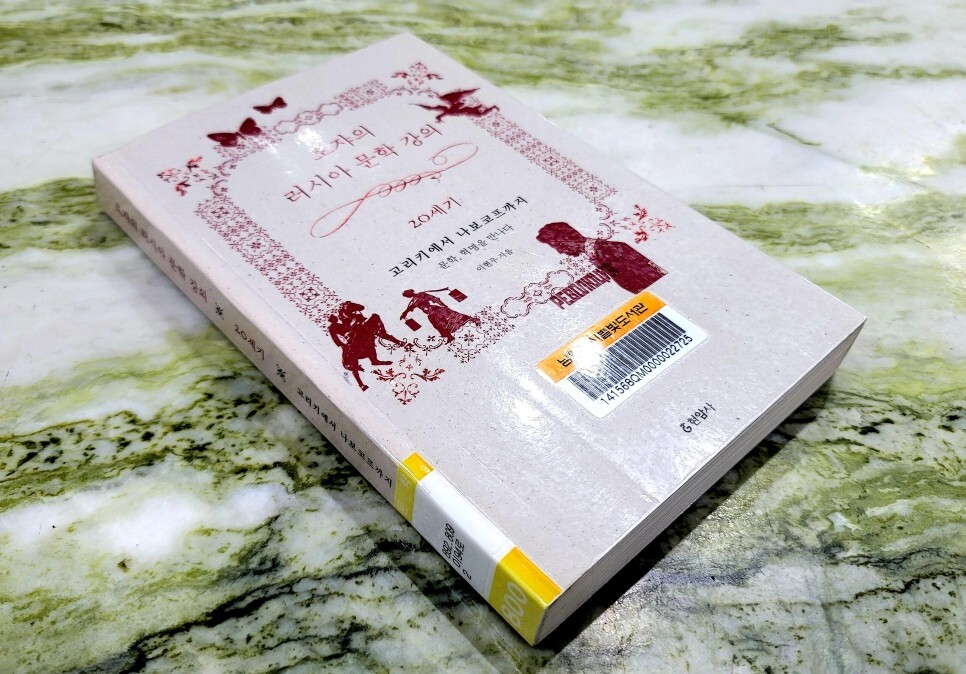
<로쟈의 러시아 문학 강의 20세기> 고리키에서 나보코프까지
#로쟈의러시아문학강의 19세기 편에 이어지는 #20세기 #고리키 에서 #나보코프 까지의 별제는
문학, 혁명을 만나다
막심 고리키는 1868년 러시아 중부 산업도시이니 니즈니노브고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리키'는 필명입니다. 본명은 알렉세이 막시모비치 페시코프인데, 알렉세이가 이름이고 막시모비치는 부칭(父稱)입니다. 막심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페시코프가 성입니다. 필명인 고리키는 러시아어로 '쓰라린'이란 뜻입니다.
'막심'은 '맥시멈'이란 뜻도 있으니 막심 고리키는 '그토록 쓰라린'이란 뜻이 되는데, 그의 필명에 이미 쓰라린 운명이
새겨져 있는 셈입니다. 10대 후반에 권총 자살을 시도했다가 폐에 구멍이 나서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거든요.
28p-8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이성이라든가 규율, 통제 등으로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기획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분명히 드러낸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목 자체가 반어입니다. 작가가 옹호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니니까요. 자먀틴은 우리들이나 단일 제국의 논리를 옹호하지도 않았고, '이성은 승리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독자에게는 정반대 독법을 요구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84p-4
이렇듯 이 소설의 주인공 노동자들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고리키의 <어머니>에 등장하는 노동자들은 단순 명확했죠.
'우리'와 '적'이 분명했고, 사회주의 건설과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 이 소설의
인물들은 혁명이 성공하여 진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서 확고한 믿음, 진리, 희망, 행복 같은 걸 아직
갖고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혁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염려합니다.
106p-14
지바고가 보기에는 현재 주어진 삶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지 그것이 뭔가 다른 시대와 다른 세대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총이기 때문에 그저 광대놀음으로 바꿀 수는 없다.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지바고의 기본 생각이고 실제로 지바고는 삶을 하나의 예술작품,
즉 시로 만듦으로써 그렇게 삽니다.
143p-14
제6강 #불가코프 의 불온한 카니발 -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 읽기
지상에는 없는 그들만의 공간,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집. 지상에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공간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장과 마르가리타는 약을 먹고 자살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그들의 공간이 있어요.
그들의 안식이 허용됩니다. 이게 망명문학적 세계관입니다. 그들에게 문학은 일종의 인공 낙원,
이 세상의 낙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새로운 낙원이었죠. 현실에서는 저주받은 실패자이자 시인이지만
그들에게는 자기들 문학국가의 주권자이자 군주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178p-1
슈호프는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잠이 든다. 오늘 하루는 그에게 아주 운이 좋은 날이었다.
영창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사회주의 생활단지'로 작업을 나가지도 않았고, 점심때는 죽 한 그릇을 속여 더 먹었다.
그리고 반장이 작업량 조정을 잘해서 오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벽돌 쌓기도 했다. 줄칼 조각도 검사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가지고 들어왔다. 저녁에는 체자리 대신 순번을 맡아주고 많은 벌이를 했으며, 잎담배도 사지 않았는가.
그리고 찌뿌드드하던 몸도 이젠 씻은 듯이 다 나았다.
240p-17
제9강 #나보코프 와 예술이라는 피난처 - 나보코프의 <롤리타> 읽기
이 작품의 비밀은 혀의 여정, 롤리타를 발음하는 여정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불멸성에 이르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Lo-li-ta'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작품 맨 마지막에서도 반복되요. '롤리타'란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된 소설이
'나의 롤리타'를 다시 부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불멸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피난처'
입니다. 시에서 라면 롤리타는 뮤즈죠. 시인이 작품을 시작하도록 해주고 끝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뮤즈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예술이란 일종의 피난처라는 것이 나보코프의 망명문학적 문학관이고 예술관입니다.
268p-18
20세기 러시아 문학, 읽어본 작품도 있고 생소한 작품도 있다. 저자가 의도한 러시아 문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19세기 위대한 러시아 작가들과 많이 다르게 보이는 혁명 이후 소련의 작가들의 고민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거대한 국토를 가진 러시아 그들의 역사와 예술이 궁금하다.
'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죄와 벌>상. 도스또예프스끼 (0) | 2022.03.17 |
|---|---|
| <도스또예프스끼 읽기 사전> (0) | 2022.03.12 |
| <풀하우스> 스티븐 제이 굴드 (0) | 2022.02.06 |
|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톨스토이 (0) | 2022.01.15 |
| 봉준호 감독 기생충 (0) | 2019.06.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