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통 지리학사> 오상학
<한국 전통 지리학사> 오상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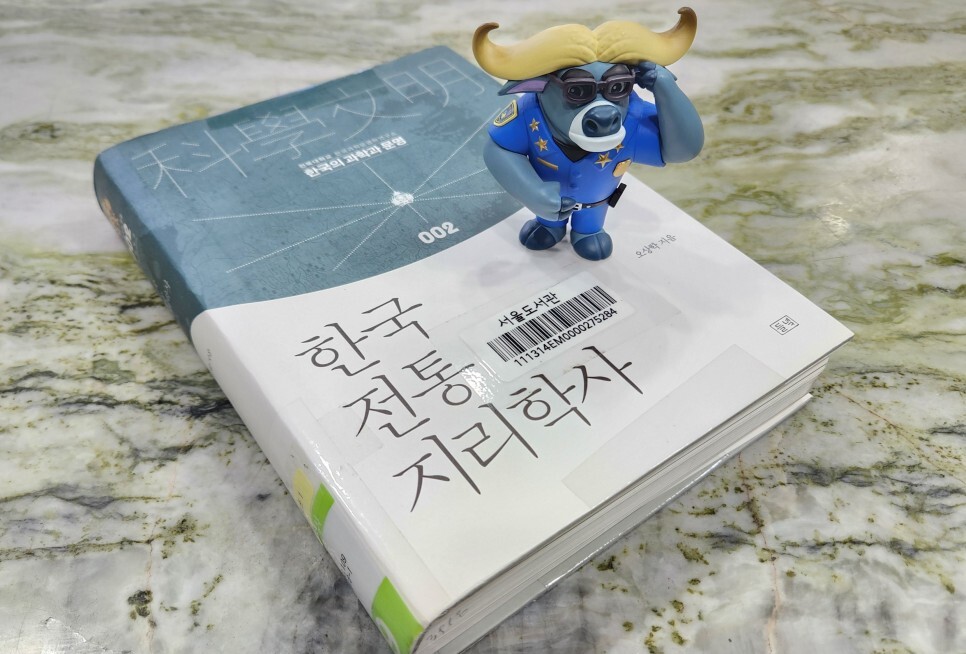
<한국 전통 지리학사> 오상학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지리학은 천문학과 더불어 오랜 역사적 연원을 지닌 전통학문으로
인식된다. <주역> 계사전의 "우러러 천문을 관찰하고 아래로 지리를 살핀다."는 구절에서도 드러나듯이
천문과 지리는 자연학이면서 우주만물의 원리를 터득하는 기본적인 지식 분야라 할 수 있다.
16p-1
1장 #전통지리학 의 내용과 성격
이상의 양반 사대부에 의한 지도 제작 외에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산자 김정호(1804?~1866?)와 같은
중인 계층의 사람들도 뛰어난 지도를 제작했다.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김정호의 경우는 신헌(1810~1884)이라는 고위 무관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 차원의 지도 제작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1834년 그의 초기 작품인 <청구도>와 같은 것은 관의 지원 없이 순수한 개인적 차원의 지도 제작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민간의 지도제작에 참여했음을 현존하는 지도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48p-9
2장 #조선시대 이전의 지리학
지도의 기본적 속성은 그림이다. 그림은 문자보다 앞서 만들어진 시각언어이기 때문에 지도의 역사도 문자보다
앞선다. 선사시대 원시인들도 그들이 경험했던 공간이나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지도로 제작했다.
북부 이탈리아의 알프스산 기슭에 있는 카모니카 계곡에서 빙식을 받은 암벽에 그려진 선사시대 지도가
이의 대표적 사례다. 이 지도는 기원전 1500년경 카모니카 계곡에 살고 있던
청동기시대 주민의 촌락과 경작지를 표현한 것이다.
91p-4
3장 #조선전기의지리학
1392년 조선 왕조가 건국된 직후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를 위해 태조는 1395년 <천상열차분야지도>라는 천문도를 돌에 새겨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했다. 이러한 의도는 조선 초기 세계지도 제작에도 반영되어
1402년 <혼일강리대국도지도>라는 세계지도가 국가적 프로젝트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131p-11
1876년 2월 26일 조선 측 대표인 대조선국 대관 판중추부사 신헌과 도총부부총관 윤자승,
일본 측 대표인 특명전권 관리대신 이노우에 가오루가 강화도조약을 체결했다.
이때 체결한 조약의 제7조는 "일본은 조선의 연해.도서.암초 등을 자유로이 측량하고 해도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다. 즉, 조선국의 연해에는 도서, 암초들이 많아 이들을 자세히 측량하고 이를 지도로 제작하여 안전한 항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일본은 이를 빌미로 조선에 대한 세밀한 측량을 진행하고
지도를 작성하여 이를 조선의 식민지 경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
403p-12
오래된 지도를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 지도가 가지는 지라학적 의미는 무엇인가하는 의문에 답하는 책
삼국시대 이전 부터 조선 건국 초기 그리고 근대지도의 역사까지 살핀 후, 한국 전통 지리학의 전개과정은
땅의 모습을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기술했던 역사임을 밝히는 책